검색결과 리스트
글
진짜 학력은 문제 없는가 | ||||
지금 경상대 정진상 교수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다. 그는 "학벌철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행의 길을 나섰다. 그 자신은 이른바 제1 서열에 드는 대학을 나와 교수가 되었는데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려 할까? 요즈음 가짜 학력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가짜 학위로 대학교수가 된 사이비도 널려 있고 유명 문화 예술인들도 '짝퉁'이 되어 직위를 얻고 행세를 해온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고백을 했건, 다른 이들이 들쑤셔 밝혀냈건 간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진짜 학력도 문제 있어 그런데 언론매체에서는 거의 논의의 중심축을 본질보다 선정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만 서둘고 있다. 왜 학력 위조가 우리 사회에 미만해 있는지, 그 근원적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진단을 소홀히하고 있다. 그 당사자들에게 몰매를 안기는 보도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학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더 고질적 문제거리를 안고 있다. 적어도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정을 두고 말하더라도 많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만 내면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 시험성적이 낙제점이라도 졸업을 할 수 있었다. 또 청강생이란 이름으로 들어가서 돈만 잘 내면 정식으로 졸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석사·박사도 적당히 베끼거나 대신 써주는 논문을 제출하면 거뜬히 졸업할 수도 있었다. 이런 졸업장과 학위를 가지고 출세하거나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한둘일까?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는 사라지지 않고 그 형태만 조금 다를 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학위공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면 왜 기를 쓰고 졸업장과 학위를 얻으려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졸업장과 학위가 있어야 출세를 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나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의 첫째조건을 여기에 두었던 것이요 그들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성실성을 아예 검증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를 획득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짝퉁'이라도 만들어내기에 혈안이 되었다. '간판'이 중시되는 사회 또 다른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러 학교에 입학하다보니 학교 서열이 저절로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 일정한 시험에 학력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주었고 박사학위는 학술 수준을 의미하기보다 간판으로 내세우는 풍조가 일었던 것이다. 해방 공간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박사라 불러 존경을 나타냈고 명예박사라도 얻으면 이를 '서브 네임'으로 사용하려 들었다. 게다가 상위 서열에 드는 학교의 출신자들이 각계에 진출해 이른바 학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동문끼리 서로 밀고 끌어주었으며 선거판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요즈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인성, 능력, 의욕은 무시되게 마련이었다. '기득권 학벌' 타파돼야 그 결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출세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게 되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고위 공직자 1천417명의 학력을 조사 비교해 보니, 대학 중퇴와 고졸 이하 경우 한국은 4.3%, 미국은 15%, 대만 30%로 나타난다고 한다. 한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미국, 대만보다 더욱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총체적 모순이 우리사회를 학벌사회로 만들었고 가짜로라도 그 대열에 끼면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명예를 획득한다는 통념이 굳어졌다. 그러니 무엇보다 출신학교나 학위는 통과의례로 보고 학교 서열의 타파, 학벌이 없는 사회의 조성, 능력과 경험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짝퉁'을 추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사회는 지적 인프라를 토대로 빠른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이화(역사학자) |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치오 가쿠의 잉어 이야기(평행우주에 대해) (0) | 2007.09.03 |
|---|---|
| 차분한 독일인, 시끄런 중국인 (0) | 2007.09.03 |
| 성격으로 본 띠 (0) | 2007.09.01 |
| 영혼이탈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 (0) | 2007.09.01 |
| 주변을 사랑하자 (0) | 2007.09.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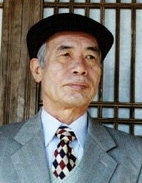

RECENT COMMENT